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해가 많이 남아 있었다. 우선 좋은 자리를 골라 텐트를 쳤다. 텐트를 다 쳐놓고 보니 많이도 낡았다. 이 텐트는 15년간 나와 함께한 캠핑의 동지다. 연둣빛 본체에 감홍색 플라이가 반짝반짝 윤이 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빛이 바랬다. 당김줄을 세게 당기면 부르르 찢어질 것처럼 탄력을 잃었다. 연륜이라 하기에는 이제 너무 초라하다. 습기를 막아주는 플라이의 방수막은 헤질 대로 헤져 보푸라기가 일었다. 그 모습이 안쓰럽다. 내 젊은 날을 함께 뒹굴던 친구 아닌 친구가 퇴락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씁쓸하다. 나는 이 텐트와 함께 무슨 일을 했던가.

이 텐트를 메고 백두대간을 종주했다. 이 텐트는 산을 오르는 고통에 악을 쓰고, 사람이 그리워 절망하던 밤에 말없이 제 속에 나를 품어주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지리산에서 모진 삭풍을 막아주던 것도 이 텐트였다. 나무마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단풍이 물든 시월의 주왕산에서 그리운 이에게 편지를 쓸 때도 녀석은 제 품을 내주었다. 빗줄기가 우악스럽게 퍼붓던 설악산 서북릉. 몸을 날려버릴 것 같은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고 꼬박 하루를 능선에서 보낼 때도 이 텐트는 온몸이 부서져라 나를 껴안았다.

이 텐트에게서 사람됨의 도리를 배웠다. 안도현 시인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너에게 묻는다)며 골목에 나뒹구는 연탄재에게서 각박한 시절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마지막 양심을 찾았다면, 나는 이 텐트에게서 희생정신을 배웠다.

텐트는 얇은 천조각과 그것을 세워주는 가느다란 폴이 전부다. 텐트는 그 것만으로 자연계의 모든 변화에 맞서 캠퍼를 지켜준다. 태양이 이글이글 불탈 때도, 빗발이 송곳처럼 박힐 때도, 바람이 제 몸을 가리가리 찢어버릴 것처럼 불 때도, 사람들의 꿈마저 꽁꽁 얼어붙는 겨울밤에도 텐트는 서 있다. 그 안에 잠든, 태양과 비, 바람과 눈보라를 맞기에는 너무 나약한 인간을 품고 말이다. 텐트의 희생을 모성애에 비유한다면 언어도단일까.
이제 나의 텐트는 퇴역을 앞두고 있다. 나의 텐트는 더 이상 빗줄기를 막아주지 못한다. 비가 조금만 와도 텐트 속이 흥건하게 젖는다. 나의 텐트는 더 이상 바람을 막아주지 못한다. 플라이가 삭아 ㄱ자로 찢어진 구멍을 통해 바람이 제 집처럼 드나든다. 나의 텐트는 더 이상 추위와 싸우지 못한다. 겨울밤마다 머리맡에 둔 물병이 꽁꽁 어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다.

그럼에도 캠핑을 떠날 때 으레 손이 가는 것은 이 텐트다. 이 텐트 말고도 싱싱한 텐트가 몇 개 더 있다. 하지만 날씨가 나쁘지 않으면 나의 선택은 늘 이 텐트다. 언젠가 이 텐트의 플라이가 살풀이춤을 추다 가르는 명주천처럼 찢어지거나 폴이 부러져 털썩 주저앉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 텐트의 최후를 함께 하고 싶다. 그것이 한 시절을 함께 한 동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에는 희생에 대한 서글픈 단상이 등장한다. 노인이 젊은 소에게 먹일 꼴을 베러 제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소를 끌고 가는 장면이 그 것이다. 병들어 지친 노인과 소,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며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한다.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스러지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지금껏 나를 위해 헌신했던 텐트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아닐까.

텐트 속에 누웠다. 바람이 잔가지를 훑고 지나는 소리가 귓가에 머문다. 그 소리 가운데는 텐트의 밭은 기침소리도 들린다. 플라이가 찢어진 구멍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 때마다 텐트는 바르르 떤다. 아무래도 집으로 돌아가면 훈장을 달아주어야겠다. 찢어진 자리에 천을 덧대 텐트를 위로해줄 작정이다. 나는 아직 이 텐트와 작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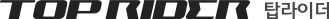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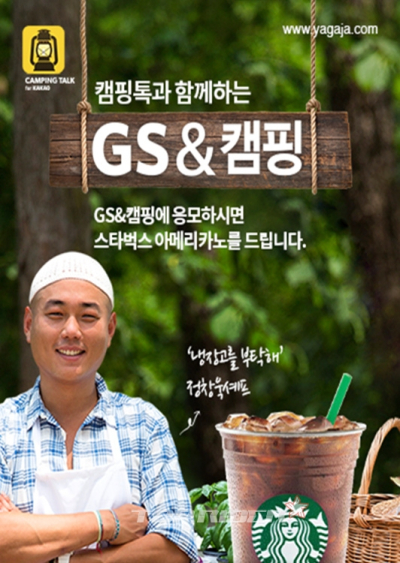









![[시승기] 푸조 3008 GT, 실연비 20km/ℓ..이쁘고 경제적](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0/31/trd20251031000001.300x200.0.jpg)





![[시승기] 푸조 3008 GT, 실연비 20km/ℓ..이쁘고 경제적](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0/31/trd20251031000001.122x80.0.jpg)
![[시승기] 아이오닉6N, 믿기지 않는 완성도의 스포츠카](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0/29/trd20251029000001.122x80.0.jpg)
![[시승기] 볼보 ES90, 이상적인 시트포지션과 승차감 구현](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0/23/trd20251023000001.122x80.0.jpg)
![[시승기] 기아 EV5, 패밀리 전기 SUV의 새로운 스탠다드](https://www.kod.es/data/trd/image/2025/09/24/trd20250924000001.122x80.0.jpg)
![[시승기] 쏘렌토 하이브리드, 5천만원에 모든 것을 담았다](https://www.kod.es/data/trd/image/2025/09/15/trd20250915000001.122x8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