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요는 슬프다. 아이들의 밝은 마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재기발랄해야할 동요는 슬프다. 적어도 내가 어릴 적 듣고 자란 동요는 그렇다.
대학교 1학년 때다. 밤새 퍼마신 술에 취해 잔디밭에 널브러져 있었다. 함께 밤을 지새운 덩치가 산만한 동기 녀석이 뜬금없이 찔레꽃을 불렀다. 느릿느릿 끊일 듯 말 듯 부르는 소리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따라 불렀다. 노래가 끝이 났을 때 녀석은 그 큰 덩치로 훌쩍거리고 있었다. 내 눈에도 눈물이 번졌다. 대학교 1학년. 우리는 생애 처음 어머니와 긴 이별을 하고 있었다.
꼭 찔레꽃만 그런 게 아니다. ‘오빠생각’이나 ‘반달’,‘섬 집 아이’, ‘해당화’처럼 지금도 술술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들 모두가 눈물샘을 자극한다. 시절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만들어진 노래는 우울한 단조 풍을 띈다고 한다. 그랬다. 이제 중년을 바라보는 사내들이 살아온 유년시절, 그 시절은 가난하고 힘들었다. 부족한 것 없이 자라는 요즘 아이들의 당당한 모습을 볼 때 간혹 당혹스러운 것도 그 때문. 그러나 시간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아왔고, 또는 견뎠다. 어른이 되어서도 위로에 목말라하고, 청승맞은 곡조를 들을 때마다 서럽게 울고 싶은 것은 다 그 시절 탓이다.

가을이 깊어지고, 낙엽들이 나목 사이로 몰려다닐 때면 마음을 적시는 동요가 있다. 김소월의 시에 가락을 붙여 만든 ‘부모’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옛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을 내가 부모 되어 알아보리라

어릴 적 이 노래를 들으면 서러워 울컥했다. 왜 서러웠을까. 나는 이 노래에서 어렴풋이나마 인생을 느꼈다. 사람이 태어나고 더불어 살다가 죽는다는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를 알아버렸다.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인생이란 것, 내가 다시 부모가 되어 알 수밖에 없는 세월의 진실 같은 것을 깨우친 것이다.
‘부모’의 노랫말 속 어디에도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는 없다. 그러나 먼 길을 돌아가듯 아우르는 노랫말의 행간에서 나는 생명이 있는 것들이 감내해야하는 고통의 그림자를 보았다. 무엇보다 서럽고 두려웠던 것은 이별이었다. 나를 둘러싼 세상, 세상의 전부와 다름 없는 엄마와 헤어지는 일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를 듣다가 서러운 나머지 엄마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영영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달라붙어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별, 그것은 어린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었다.

세월이 흘러 내가 부모가 됐다. ‘부모’를 듣고 서러워 가슴이 미어졌던 미소년에게는 그 때 그만한 나이의 아이가 생겼다. 그리고 동요 속 그 겨울밤처럼, 어머니와 마주앉아 나누던 이야기들을 다시 아이와 나누고 있다.

모닥불을 쬐며 나긋한 목소리로 ‘부모’를 불러본다. 그 노래와 함께 유년시절로 달려간다. 누군가 꽁꽁 숨겨두었던 생의 비밀을 엿보고는 서러워서 그만 울어버렸던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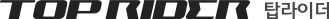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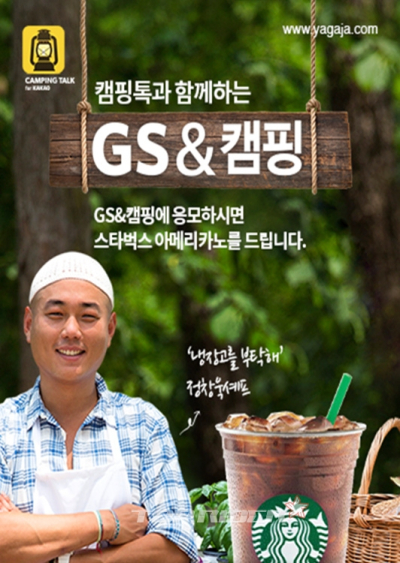




![[시승기] 푸조 3008 GT, 실연비 20km/ℓ..이쁘고 경제적](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0/31/trd20251031000001.300x200.0.jpg)










![[시승기] 푸조 3008 GT, 실연비 20km/ℓ..이쁘고 경제적](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0/31/trd20251031000001.122x80.0.jpg)
![[시승기] 아이오닉6N, 믿기지 않는 완성도의 스포츠카](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0/29/trd20251029000001.122x80.0.jpg)
![[시승기] 볼보 ES90, 이상적인 시트포지션과 승차감 구현](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0/23/trd20251023000001.122x80.0.jpg)
![[시승기] 기아 EV5, 패밀리 전기 SUV의 새로운 스탠다드](https://www.kod.es/data/trd/image/2025/09/24/trd20250924000001.122x80.0.jpg)
![[시승기] 쏘렌토 하이브리드, 5천만원에 모든 것을 담았다](https://www.kod.es/data/trd/image/2025/09/15/trd20250915000001.122x8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