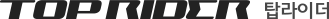저녁놀이 복사꽃밭에 드리웠다. 복사꽃은 그 노을을 받아 한껏 뺨이 붉어졌다. 봄이 무르익은 느낌이다. 눈길을 조금만 돌렸다가 되돌려도 세상이 변하는 게 느껴졌다. 그새 민들레 홀씨는 훌쩍 하늘로 날아올랐다. 복사꽃 꽃망울 하나가 살포시 꽃잎을 열고 수술을 드러냈다. 벌 한 마리가 급한 날갯짓으로 배꽃으로 날아갔다. 세상이 그림 속 풍경처럼 정지된 것 같았지만 자연계의 순환은 바쁘게 시간을 따라 움직였다. 그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질서를 노을은 또 파도처럼 밀려와 물들이고, 창끝처럼 뜨겁게 찔렀다.

꼭 긍정의 답을 얻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냥 지나는 말로 꽃밭에서 하룻밤 자고갈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씨 좋은 농부가 덜컥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닌가. 노을 속의 꽃밭을 두고 돌아서기가 내내 아쉬웠던 차에 뜻하지 않은 횡재를 얻은 것이다.
배꽃 터널 속에 작은 텐트를 쳤다. 그새 노을은 서산으로 멀찍이 물러났다. 배꽃 위로 모습을 드러낸 동녘의 하늘은 푸르다. 봄날의 이 파란 하늘은 또 얼마만인가. 언제부턴가 우리의 봄날은 황사에 저당 잡혔다. 봄날의 대부분은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대기가 탁하다.
텐트에 누워 배꽃이 랜턴 빛에 노랗게 물든 모습을 바라볼 때였다. 무엇인가 허전했다. 아니, 이 허전함은 복사꽃과 배꽃을 찾아 나섰을 때부터 느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향기의 부재였다. 오후 내내 복숭아밭과 배밭을 싸돌아 다녔지만 나는 꽃향기를 맡을 수가 없었다. 꽃이라면 당연히 향기가 있어야 한다. 그 향을 따라 벌이 날고, 그 벌의 다리와 주둥이에 붙은 꽃가루가 수정하여 과실이 열리는 것이다. 게다가 복숭아는 천상의 과일로 불릴 만큼 단 과일이 아니던가.

텐트 밖으로 나와 배꽃에 코를 댔다. 마치 보르도 그랑크뤼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소믈리에처럼 코를 박고, 있는 힘껏 향을 빨아들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였다. 배꽃의 향기가 콧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옅은 그 향은 무엇일까, 배냇저고리에 배인 아이의 젖비린내처럼 들척지근한 단내였다.
향기 하면 밤꽃을 따라올 꽃이 없다. 그것도 칠흑같이 어두운 그믐달 속의 밤꽃은 아편만큼 강렬하다. 바람도 없이, 대기는 낮은 곳으로 고요히 침잠할 때 밤나무 아래를 거닐면 끈적끈적한 향기가 발목을 칭칭 감는다. 함부로 숨을 들이킬 수가 없다. 생각 없이 큰 숨을 들이켰다가는 그 농익은 향기에 숨이 멎을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만큼 강렬하다. 밤꽃 향기에는 욕정이 묻어 있다. 그 비릿한 향기는 뜨거운 사랑을 나눈 뒤 사내의 몸을 빠져나온 정액냄새와 같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밤꽃이 피면 처녀들을 밤나무 곁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밤꽃과 비교하면 배꽃은 얼마나 수수한가. 이렇게 꽃그늘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도 있는 둥 마는 둥 그저 은은하게만 스며들 뿐이니 말이다. 때로 넘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다.

사람의 마을에 피어난 노란 나트륨등이 어둠 속에서 점점 농익는다. 시골의 밤은 소리도 없이 깊어만 가고, 나는 복사꽃밭에 앉아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김산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mountainf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