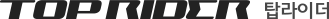커피를 마시며 재즈의 선율이 흐르는 라디오를 듣고 있을 때였다. 샌들을 신고 있는 발에서 갑작스런 통증이 느껴졌다. 정확히 둘째 발가락 두 번째 마디 부분이었다. 발가락뼈를 바늘로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어찌할 줄을 몰라서 폴짝폴짝 뛰었다.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다 나에게 이 아픔을 안겨준 녀석이 궁금해졌다. 무엇이었을까. 분명 독을 가진 생명체에게 물린 것이 분명했다. 땅벌이었을까. 독거미는 아닐까. 혹시 쐐기가 깨문 것은 아닐까. 그러나 빨갛게 부풀어 오른 상처만 가지고서는 녀석의 실체를 알 수가 없었다.

통증은 의외로 길고 오래 갔다. 텐트에 누웠을 때도 욱신욱신 쑤셨다. 무엇이었을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존재는. 왜 나를 공격했을까. 나는 어떤 적의도 드러내지 않았는데, 왜 나를 표적으로 삼은 것일까.
생각이 여기에 미쳤을 때 나는 멈칫 했다. 나는 과연 나를 문 벌레에게 적의를 드러내지 않았을까. 나는 어둠 속에 눈길을 준 채 벌레에 물리던 그 순간으로 천천히 시간을 되돌렸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테이블 아래에 있는 발을 경쾌하게 까닥거렸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장단을 맞췄던 것이다. 어쩌면 벌레는 이런 나의 행동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 여겼을 지도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과학상식으로도 어떤 곤충이든지 상대가 되지 않는 적에게 먼저 공격을 가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만 목숨을 걸고 ‘방어적’ 공격을 한다. 그 공격의 결과는 때로 곤충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침을 놓는 것으로 세상을 하직하는 꿀벌처럼 말이다.

세상에는 두 개의 시선이 있다. 바라보는 나와 나의 시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시선. 우리는 늘 바라보는 입장에서 생각한다. 나와는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모른 체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에 갇힌 또 다른 존재가 있고, 그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
통증은 찌르레기 울음소리가 텐트 속에 비처럼 나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김산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mountainf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