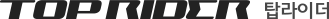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휴양림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미천골 자연휴양림을 찾은 것은 전국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날이었다. 온종일 비가 퍼부었다. 계곡물도 급하게 불어났다.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굵은 빗줄기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텐트 속에서는 빗방울 긋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급하게 쏟아져 내려가는 계곡물 소리만 귀청을 따갑게 했다.
휴양림 직원은 비가 더 내리면 다리가 잠길 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 며칠 동안 고립될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고립되는 상황까지 맞아가며 캠핑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대로 떠나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비를 맞으며 텐트를 걷을 일이 꿈만 같았다. 또 며칠쯤 책을 보며 쉬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설령 다리가 물에 잠겨 며칠을 나갈 수 없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남겠다고 했다. 휴양림 직원은 마지막으로 식량은 충분한지 묻더니 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후에 돌아섰다.

휴양림 직원이 돌아간 후 캠퍼들은 서둘러 철수를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큰 일이 날 것처럼 서두르는 것이 마치 텐트 빨리 걷기 대회를 벌이는 모습이었다. 한편으로는 비에 홀딱 젖어 텐트를 걷는 모습이 측은해 보이기도 했다. 그들을 뒤로 하고 다시 텐트 속으로 들어갔다.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고 읽다만 책을 펴들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캠핑장이 궁금했다.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텐트 안에 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텐트를 모두 걷었을까. 내심 궁금했다. 텐트 문을 조그맣게 열었다. 계곡을 따라 일렬로 쳐졌던 텐트는 모두 사라졌다. 그 새 모두 철수한 것이다. 다들 갔구나. 왠지 허전했다. 애초부터 혼자이던 것과 사람들로 왁자지껄하다 홀로 남겨지는 기분은 사뭇 다르다. 서운하기로 치자면 뒤의 경우가 몇 배 더하다.

아쉬운 마음에 캠핑장에 한 번 더 눈길을 주었다. 앗, 모두 떠난 게 아니었다. 처음 내가 바라봤던 곳의 반대편에 텐트 한 동이 남아 있었다. 누굴까. 아직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도 나갈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텐트의 존재를 확인하자 조금은 안심이 됐다. 동지가 생긴 것이다. 사실, 귀가 멍멍할 정도로 들리는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약간의 겁을 먹었던 참이었다. 안전한 곳에 텐트를 쳤다고는 하지만 계속 불어나는 계곡물을 보면서 오늘 밤 넘길 일이 걱정됐다.
그 텐트의 주인은 혼자가 아니었다. 삼십대 후반의 남자와 아내, 그리고 두 딸까지 있었다. 장비는 초보티를 벗을 만큼 갖췄다. 폭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사이트도 구축했고, 텐트도 방수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는 왜 남았을까. 휴양림 직원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곳에 남기로 작정한 사내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그는 또 가족과 함께 있지 않은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가장이라면 누구나 안전을 우선 고려한다. 그런데도 그는 모두가 철수한 캠핑장에 남기를 결심했다. 왜 그랬을까. 나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다.
사내를 만난 것은 취사장에서였다. 이른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도 설거지통을 들고 나타났다.
“이거 동지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가족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함께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게 말문을 트고 나서 우리는 저녁 준비도 미룬 채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동대문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몇 년 전부터 캠핑에 맛이 들려 동호회도 가입하고, 장비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었다. 옷 장사는 하루도 쉴 수가 없다고 했다. 사람들이 대부분 밤에 쇼핑을 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장사를 하고 낮에는 잠을 자야만 했다. 주말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다. 일주일에 꼬박 7일 장사를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평일을 이용해 쉬는데, 그 때는 밀린 잠을 자기에 바빴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낙이 여름휴가였다. 이 때 만큼은 일주일쯤 휴가를 내서 캠핑을 가기로 온 가족이 굳게 약속을 했다.
사내는 이번 캠핑이 여름휴가라고 했다. 사람들로 복닥거리는 성수기를 피해 일찍 휴가를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렵게 캠핑 사이트를 구축하자마자 떠나라고 하니 그럴 수가 없었다고 했다. 지금 철수를 하면 다시 텐트를 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사실이다. 텐트를 걷다보면 모든 것이 젖기 마련이다. 그렇게 젖은 장비를 이용해 다시 캠핑 사이트를 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비는 앞으로 사흘 가량 더 내릴 예정이란 일기예보도 있었다. 그래서 사내는 남기로 결심했다. 설령, 다리가 떠내려가도 일 년을 별러왔던 캠핑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캠핑이 그리 좋으세요?”
“예.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아빠 노릇하는 것은 캠핑 왔을 때뿐입니다.”
나는 그의 캠핑 사랑에 따뜻한 미소를 얹어주고 텐트로 돌아왔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퍼부었다. 어찌나 많이 내리는지, 책을 읽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불어난 계곡을 의식하고 있었다. 가끔씩 텐트 문을 열고 수위를 확인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캠핑장에 어둠이 찾아왔다. 빗줄기는 여전했다. 계곡 물은 더 불어나 있었다.
우산을 들고 계곡의 수위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 틈에 그가 곁에 와 섰다.
“괜찮겠지요?”
“그럼요. 제가 계곡 수위를 지켜보고 있는데,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계속 수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분명 마음 한 구석에 일말의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의지할 것이라고는 서로에게 단 둘 뿐인 이웃이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다. 애초부터 아늑한 잠은 멀었다. 계곡물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그 소리에 다시 잠이 깼다. 그렇게 깨다 자다를 반복하다 끝내 까무룩 잠이 들었다.
눈을 떴다. 텐트 밖이 훤했다. 다행히 밤새 안녕이었다. 텐트에 듣던 빗방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텐트 문을 열었다. 자욱한 안개가 앞산에 걸쳐 있었다. 비 온 뒤라 초록이 더욱 짙었다. 그 안개를 밀치며 아침 해가 솟고 있었다.
내 텐트와 함께 캠핑장을 지킨 또 하나의 텐트 문도 열렸다. 사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안개와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 아침 해를 가리켰다. 사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룻밤 사이에 그와 나는 절친한 이웃이 돼 있었다.

김산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mountainf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