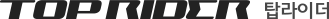아들 녀석은 잠들어 있다. 나는 몰래 텐트를 빠져 나왔다. 캠핑장에는 어둠이 가득하다. 낚싯대를 챙겨서 강으로 향한다. 급류를 타고 흘러가는 강물 소리에서 한기가 묻어난다.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신새벽에 강물에 발을 담그는 일이 꼭 즐겁지만은 않다. 그러나 어쩌랴. 손맛을 보려면 새벽이 최적의 시간인 것을. 동트기 전과 해질 무렵에 물고기의 먹성이 가장 활발하다는 것쯤은 초보 낚시꾼도 안다.

강물 속에 누군가 있다. 물살이 세차지는 강의 한 가운데서 누군가 하류를 향해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다. 아마도 그는 밤새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진정한 꾼이다. 푸른 여명 속의 그는 미동도 않고 앉아서 찌만 노려보고 있다. 그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새삼 낚시의 즐거움이 느껴진다.
캐스팅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질이 왔다. 나는 이 느낌이 좋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 전해지는 경쾌한 당김이 참 좋다. 온몸의 말초신경이 곤두서서 오직 물고기의 입질에만 집중된다. 이건 몰입이다. 이 순간은 나의 모든 감각과 신경이 오직 하나, 물고기에게 향하는 물아일체의 순간이다.
입질은 결정적인 순간, 챔질로 이어진다. 물고기의 주둥이에 바늘이 확실히 꽂히도록 비호첢 낚싯대를 낚아챈다. 낚싯대를 낚아채는 속도는 생각의 속도 보다 빨라야 한다. 낚싯대 초리가 까닥이면 무조건반사로 챔질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면 빛의 속도 보다 빨라야 한다. 그 찰나의 순간이 낚시의 운명을 가른다. 물고기의 생과 사가 그 찰나에 결정된다.

챔질에 성공하면 물고기와의 한판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나와 물고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낚싯줄이 수면을 뚫고 들어간 물 속 어딘가에서 마주한다. 비록 서로를 볼 수는 없지만 나와 물고기는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 서로를 느낀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지워지고, 미끼를 문 물고기와 나만이 존재하는 기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까.
미끼에서 벗어나려는 물고기의 움직임은 얇고 투명한 낚싯줄에 고스란히 전해진다. 물고기가 도망치기 위해 꼬리지느러미를 튕길 때의 파동도, 물고기가 바위틈을 향해 사력을 다해 머리를 박을 때의 몸부림도 낚싯줄을 타고 온다. 물고기의 저항이 느껴지면 내 안의 수렵본능도 깨어나 눈을 번뜩이게 한다.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한다.
이건 희열이다. 내 몸의 감각을 모두 일깨우는 희열이다. 이 희열은 물고기의 저항이 거세질수록 더 벅차오른다. 일찍이 내가 이처럼 생명체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던가. 미끼를 문 것은 물고기가 아니다. 나를 둘러싼 강과 산과 대지와 바다와 하늘이다. 생명의 근원인 자연이다. 낚싯줄은 자연이 내게 보내는 싱싱한 피를 실어 나르는 핏줄이다. 나를 잉태한 자연과 연결된 탯줄이다.

팽팽히 당겨진 낚싯줄의 긴장은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진다. 물고기가 저항을 포기한 것이다. 물고기는 제 안의 모든 힘을 다 쓰고 나면 항복을 선언한다. 낚싯줄을 감아도 순순히 딸려온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나의 번뜩거리던 눈도, 마음 속 긴장의 끈도 탁 풀어지고 만다. 물고기가 저항을 포기한 순간 승부는 끝난 것이다. 남은 것은 잡은 물고기를 확인하는 절차뿐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절망에 찬 눈빛을 보내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일은 안쓰럽다. 물고기는 두려움에 바르르 몸을 떤다. 이 두려움은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물고기가 할 수 있는 저항은 아무 것도 없다. 물고기를 거둘 것인가, 아니면 자연으로 돌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처분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내가 물고기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이 순간만큼은 내 자신이 조물주와 버금가는 존재다.
어쩔 것인가. 물고기의 명줄을 끊고 싶은 욕망이 불쑥 고개를 내민다. 그러나 그 욕망을 애써 누른다. 물고기 입에 걸린 바늘을 조심스럽게 뺀다, 물고기가 꼬리를 치며 단발마의 저항을 한다. 나는 녀석을 가만히 물에 놓아준다. 물고기는 중심을 잡지 못한다. 지금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를 까닥일 힘조차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한동안 비틀거리던 녀석이 다시 힘을 낸다. 몸이 똑바로 서면서 꼬리지느러미를 경쾌하게 친다. 물 만난 고기로 돌아온 것이다. 물고기는 천천히 나의 시야를 빠져 나간다. 강물의 깊은 품을 찾아 떠난다.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이 지배하는 자연계에서 인간은 신과 동급으로 군림한다. 인간이 마음먹으면 못 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로 돌아오면 그 먹이사슬은 역전된다. 자연계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점유하던 한 인간도 인간세계에서는 아주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 때도 있다.
문명의 도시에는 우리의 명줄을 잡고 있는 숱한 절대자가 존재한다. 그들은 사회적 관계, 인간 내에 존재하는 먹이사슬에서 정점에 있는 사람, 혹은 권력이다. 대부분의 우리는 그 사람, 혹은 권력 앞에 나약하다. 물고기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자였던 내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 같은 사회의 먹이사슬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를 차지한 채 누군가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관대해져야 한다. 내가 부린 만용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다시 내 목을 겨눈다.
물고기를 보내고 나면 뿌듯하다. 한 생명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 스스로가 대견스럽다. 물론 빈 바구니로 캠핑장에 돌아가면 아들 녀석은 입이 삐죽 나올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아빠의 능력도 보잘 것 없어 질 것이다. 그래도 좋다. 오늘 한 생명을 살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낚시를 포기할 수는 없다. 챔질을 하는 순간, 낚싯줄을 타고 전해지는 물고기의 탄력 넘치지는 저항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이 손맛에 중독되면 죽을 때까지 낚시에서 헤어날 수 없다.

김산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mountainf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