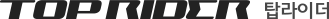비 온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다. 한 눈에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무지개였다. 소년은 무지개를 갖고 싶었다. 소년은 무지개를 잡아오겠다며 엄마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엄마는 그런 소년을 눈물로 배웅했다. 소년은 숲과 들과 산과 강을 건넜다. 그러나 무지개는 잡히지 않았다. 소년이 한걸음 다가가면 무지개는 한걸음 물러났다. 소년이 지쳤을 때 무지개는 한걸음 더 다가왔다. 그러나 소년이 용기를 내면 무지개는 다시 뒷걸음질 쳤다. 소년은 많은 소년들을 만났다. 그들도 무지개를 찾아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무지개를 잡은 소년은 없었다. 소년은 그들을 뒤로 하고 마지막 용기를 내서 무지개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무지개는 더 멀리 달아났다. 소년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지쳤다. 소년은 무지개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소년의 검은 머리는 백발이 됐고, 동안의 얼굴에는 주름이 성겨 있었다.
- 김동인, ‘무지개’ 줄거리 -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길이 좋았다. 세상을 향해 열린 길을 걷는 게 좋았다. 사내는 세상의 모든 길을 걷고 싶었다. 산으로, 바다로, 숲으로, 미처 알지 못했던 어느 문명으로 이어진 길을 걷고 싶었다. 그는 인생도 먼 우주에서 지구라는 낯선 별로 떠나온 여정이라고 여겼다. 사내는 길을 걷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의 몸은 젊고 탄력이 넘쳤다. 그의 눈은 낯선 곳을 향한 욕망으로 이글이글 불탔다. 그에게 한계는 없어 보였다. 오르지 못할 산이 없었고, 가지 못할 곳이 없어 보였다. 때로는 고통조차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기 위한 동행이라 믿었다. 가족이 있었지만 새로운 길을 향한 그의 동경이 우선이었다.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의 발가락과 자신의 발가락이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그는 길을 떠나는 것을 조금 망설였다. 아이를 두고 길을 나서는 것은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아픔을 안겨주었다. 그래도 사내는 길을 나섰다. 그는 여전히 길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이별의 아픔 없는 길은 없다고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내의 걸음걸이가 무뎌지기 시작했다. 한창때는 작아 보였던 배낭도 힘에 부쳤다. 길을 가다 걸음을 멈추는 일이 잦아졌다. 뒤를 돌아보는 시간도 많았다. 사내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고 여겼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 청년이 맞아 주었다. 청년의 몸은 사내가 젊었을 때처럼 우람하고 탄력이 넘쳤다. 청년의 눈은 생기가 넘쳤다. 한 여인이 청년 곁에 다가와 섰다. 처녀 적에 눈매가 서글서글했던 여인은 중년의 고개를 넘어서고 있었다. 여인은 초라한 몰골의 사내에게 따스한 미소를 보냈다. 사내는 여인과 청년의 품에 안겼다. 사내는 비로소 길의 종착점에 닿은 것이다.
김산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mountainf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