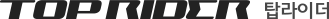F1 2015시즌은 공식적으로 오는 3월 중순 호주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지난 2월 초 헤레즈에서 첫 번째 프리시즌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사실상의 경쟁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다. 챔피언십 포인트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기록은 의미가 없지만,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시즌 초반의 경쟁 구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5시즌 개막을 앞둔 프리시즌 테스트가 지난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레이스카들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규정 변화와 맞물려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져 정상적인 테스트가 불가능한 경우가 잦았다. 차량 중에는 조종성이 크게 떨어지고 퍼포먼스가 들쭉날쭉한 레이스카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에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페라리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페라리에서 가장 눈에 띄게 향상된 부분은 바로 밸런스였다.

우리 페라리가 달라졌어요
2014시즌 페라리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두 명의 챔피언 출신 드라이버로 화려한 라인업을 꾸렸지만, 레이스카가 문제였다. 기대를 모았던 페라리 F14-T는 모든 면에서 경쟁 팀의 레이스카에 비해 부족했다. 파워 유닛은 메르세데스에 비해 형편 없는 출력을 보여줬고, 신뢰도 면에서만 앞섰을 뿐 퍼포먼스 자체로만 본다면 르노 파워 유닛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이 많았다. ERS에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해 레이스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건 덤이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크게 감소된 리어 다운포스를 최대한 보전하려는 시도도 무산됐다. F14-T가 만들어내는 리어 다운포스는 대형 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덕분에 프론트에서 높은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프론트 다운포스를 만들기 위해 리어 다운포스를 희생한 셈이었다. ) F14-T의 셋업은 차량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프론트 다운포스를 줄이는 미봉책을 택해야 했고, 결과적으로 조종성이 엉망인 차가 나왔다. 낮은 다운포스 덕분에 타이어 온도는 오르지 않았고,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손상된 이후에야 충분한 온도에 도달했다.
다운포스가 낮고, 조종성이 엉망이며, 파워 유닛은 힘이 없는 레이스카. 레이스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타이어 관리가 안 되는 차. 이것이 2014년 페라리의 F14-T였다. 페라리가 최악의 시즌을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 면에서 2015시즌 프리시즌 테스트에서 나타난 새로운 레이스카 SF15-T의 모습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단순히 랩 타임에서 앞선 것이 문제가 아니라(프리시즌 테스트의 랩 타임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 차량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 문제였다.
처음 선보인 SF15-T는 셋업에 의해 프론트 다운포스를 희생하지 않았다. 리어 다운포스가 다른 팀에 비해 얼마나 강력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적어도 극단적으로 다운포스를 낮춰 조종성을 희생하지는 않았다. 타이어 온도는 빠르게 올랐고 레이스카는 피트를 벗어나자마자 드라이버의 주문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였다. 한마디로 밸런스가 잘 맞는 레이스카였다. 페라리는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를 분명히 극복하면서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보검 한 자루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장점 한 두 가지로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다. F1뿐 아니라 모든 모터스포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최고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정상에 도전할만한 수준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 한 두 부분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어떤 레이스에서 깜짝 활약을 보일 수도 있고, 기대치 않았던 성적을 단편적으로 거둘 수는 있다. 그러나 세계 각지를 돌며 스무 번을 치르는 F1 월드 챔피언십에서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편적인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해 레드불은 힘겹게 시즌을 시작했지만 어쨌든 가장 뛰어난 다운포스를 가진 RB10이 있었다. 조종성도 뛰어났고 코너를 통과할 때마다 대부분의 다른 레이스카보다 빠른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파워 유닛은 레드불의 취약점이었고, 결국 메르세데스와의 경쟁을 어렵게 만들었다. 다른 팀 레이스카들의 조종성이 눈에 띄게 향상된 시즌 후반에는 2위 팀이라는 기록이 무색하게 상위권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윌리암스의 경우 가장 강력한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을 공급받는 팀이었고, 가장 낮은 드래그가 발생하는, 즉 공기 저항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차량을 보유했었다. 시즌 초반 몇 가지 차량 문제와 불운이 겹치기는 했지만, 어쨌든 차량의 스피드 하나로만 본다면 그리드 최강이라고 할 수 있었다.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차가 바로 윌리암스 FW36이었다.
하지만 다른 성능에서는 메르세데스 워크스 팀에 비해 눈에 띄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단 한 번의 우승도 이뤄내지 못했다. 한 가지 부문에서만 뛰어난 차라면 포스인디아나 로터스도 내세울 구석들은 있었다. 포스인디아의 경우 최고 속도와 타이어 관리에 특화된 팀의 강점을 내세워 레이스에서 언제나 선전했고 시즌 초반 컨스트럭터 순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로터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한 레이스카였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리어 다운포스를 뽑아낼 수 있었고 웻 컨디션에서 선전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에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포스인디아는 결국 우승권에서 멀어졌고, 다른 모든 성능이 처참했던 로터스는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밸런스가 챔피언을 만든다
시계를 2009년으로 돌려보면, 밸런스가 F1 레이스카의 성능에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2008년까지 혼다의 워크스 팀이었던 ‘브래클리’의 F1 팀은 혼다의 F1 철수와 함께 공중 분해 위기에 몰렸었다. 하지만 브런GP로 간신히 생명을 연장한 브래클리 팀은 2009시즌 초반부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양대 챔피언 타이틀을 모두 거머쥐었다. ‘더블 덱 디퓨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브런GP였지만 단지 더블 덱 디퓨저 한 가지만으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2009시즌을 시작할 때 더블 덱 디퓨저를 일찌감치 사용한 선구자격인 팀은 브런GP 뿐이
아니었다. 윌리암스와 토요타가 이미 더블 덱 디퓨저를 사용해 빠른 레이스카를 보유하고 있었고, 팀의 운명이 풍전등화였던 브런GP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개발을 진행해왔다.
풀-로드 방식의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으로 리어 엔드를 혁신한 레드불은 더블 덱 디퓨저가 없어도 그에 못지 않은 리어 엔드의 다운포스를 뽑아내고 있었다.
브런GP가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했다는 점 역시 엄청난 장점이라고만 볼 수는 없었다. 당시 메르세데스 엔진이 강력한 엔진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메르세데스의 준 워크스 팀처럼 활동했던 맥라렌과 달리 브런GP는 뒤늦게 메르세데스 엔진을 선택해 억지로 차량에 꾸겨넣은 상태였다. 결국 엔진의 힘과 더블 덱 디퓨저의 장점이 더해지는 정도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2009년 챔피언십을 손에 넣은 브런GP BGP001의 최대 강점은 밸런스였다. 리어 엔드의 높은 다운포스가 한 몫 했겠지만, 어떤 브레이킹 상황과 어떤 코너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세가 유지되는 놀라운 밸런스는 다른 팀들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장점이었다. 잘 잡힌 밸런스가 만들어내는 안정성 덕분에 ‘유려한 드라이빙’이 장끼인 버튼은 자신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었고, 팀과 함께 버튼 자신도 드라이버 챔피언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브런GP의 레이스카는 챔피언을 향해 맘껏 속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인내와 절제의 스피드 경쟁?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른는 F1 엔지니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의 페라리는 강력한 프론트 다운포스를 희생하면서 조금이라도 밸런스를 잡으려고 했다. 반대로 높은 리어 다운포스를 구현했지만 프론트 다운포스가 엉망이었던 맥라렌은 리어 다운포스를 희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노력은 높은 수준의 밸런스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두 팀 모두 최악의 성적을 얻게 만들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쉽게 이룰 수 없는 도전 과제가 바로 밸런스다. 게다가 차량의 밸런스는 단순히 다운포스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파워 유닛의 힘은 타이어의 그립과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그립이 버텨주지 못하면 파워 유닛이 만든 강한 토크는 스핀을 만들어낼 뿐이다. 서스펜션이 엉망인데 브레이크만 강력하다고 해서 제동이 잘 될 리 없다. 레이스카의 밸런스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돼 있는 셈이기 때문에 더더욱 맞추기가 어렵다.
때문에 밸런스를 잡는 작업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과정이다. 결코 욕심내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주 조금씩 조금씩, 한 부분 한 부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천재 엔지니어 한 명이 갑자기 레이스카의 성능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서두르는 순간 밸런스는 무너진다. 욕심을 부려도 밸런스는 무너진다.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 후폭풍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극한의 스피드를 다투는 F1의 개발 경쟁이 사실은 인내와 절제의 느리고 지지부진한 싸움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2015시즌 페라리와 맥라렌은 자신들의 레이스카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 획기적인 시도를 했고, 프론트 엔드의 변화에서 각자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비록 맥라렌은 혼다의 새 파워 유닛과 관련된 이런저런 문제로 정확한 성능을 가늠할 길이 없었지만, 페라리는 눈에 띄게 향상된 밸런스로 주목 받았다. 페라리의 경우 적어도 위닝카를 만들기 위한,’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제 F1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자리를 지켜온 페라리가, 부족한 퍼포먼스를 ‘아주 조금씩’ 메꿔 나가는 인내와 절제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며 2015시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차례다.
※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재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jesusyo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