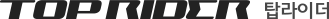물의를 빚은 연예인이 TV 화면에 나와 눈물을 흘린다. 시청자들은 이내 등을 돌린다. 얼굴이 예쁘다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그런건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잘나가고 능력을 인정 받았던 인물일 수록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듯 하다. 순진한 표정이더니 뒤에서 그럴줄은 몰랐다는 식이다. 하나가 불만이면 나쁜점만 줄줄이 보이게 되기 마련이다. 작은 흠 하나가 다른 장점 모두를 뒤집는, 다시말해 스펙이 아니라 감정이 성패를 좌우 하는 일이 요즘 세상엔 빈번히 일어난다.
벨로스터 터보도 같은 이유로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운전해보면 달리기는 매우 잘한다. 1.6리터 GDi 터보엔진을 장착해 204마력이나 되니 어련할까. 순식간에 시속 150km까지 올려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연비도 비교적 우수하다. 숫자로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스펙'은 누가봐도 훌륭하게 잘 쌓았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소홀히 한게 눈에 띈다. '옥의 티' 하나가 차의 모든 장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개발하는가'를 정하는 작업이 어영부영 생략된 듯 하다.

아반떼를 기본으로 가지치기 한 이 차는 형제차와는 전혀 다른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어야 했다. 만약 스포츠카를 지향했다면(하다못해 '스포티'카였더라도) 이런 핸들을 달아놔선 안됐다.
시승차의 경우 시속 100km 이내의 중저속에서는 직진이 제대로 안됐다. 핸들을 동작시키는 전기모터는 회전 후 중심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 핸들을 조작하고 나면 여지없이 오른쪽으로 조금씩 꺾이게 된다. 모터가 핸들 자체를 꺾어버리니 휠 얼라인먼트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코너를 돌 때도 마찬가지로 핸들을 조금씩 조정하지 않으면 차가 차선을 빠져 나가버린다. 그러니 핸들을 쥔 손에서 힘을 풀지 못했고, 한시간 정도 운전을 하니 팔이 아플 지경이었다. 그저 시승차만의 문제이기만 바랄 뿐이다.
속도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 점도 아쉽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우선, 시트가 아반떼와 같은 수준으로 높고 전면 천장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운전자 시야를 선바이저가 가로막고 있어 차에 타면 어수선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좁은 앞유리 저편으로 도로가 내려다 보이니 속도감도 적고 노면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게 당연하다.
사실 새로운 터보엔진은 합격점을 줄 만하다. 1.6리터 엔진을 장착한 차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가속되는 점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터보가 동작하는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느껴지는데, 터보가 좀 과격하게 동작하는 느낌이 드는 세팅이다. 저 RPM에서도 더 저음의 배기음이 느껴지고 꾸준한 느낌이었다면 좋았을 것 같긴하다.
그런데 작년 3월 이 차가 시장에 나온 초기 평가가 압박으로 작용할 것 같다. 당시 현대차는 무슨 생각에선지 이 차에 아반떼와 동일한 1.6리터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이다. 스포티한 외관에 걸맞지 않는 가속력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저널리스트들의 비아냥을 한몸에 받고 있다. 옥의 티들이 훨씬 크게 부각됐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인기 스타도 실수 하나로 외면 받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현대차는 이미 실망으로 삐딱해진 세계인들의 시선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궁금해진다.
김한용 기자 〈탑라이더 whynot@top-ri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