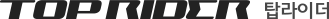텐트 문을 열자 안개가 자욱하다.
강에서 피어난 안개가 낮은음자리로 몰려와 사위를 휘감았다.
짙은 안개 속에 등 굵은 소나무가 아련하게 서 있다.
소나무는 곧게 뻗은 것이 없다.
제멋대로 굽이지고, 배롱나무처럼 뒤틀렸다.
한 두 그루가 아니다.
소나무들은 어울려 숲이었다.
한 폭의 그림이었다.
한지에 먹물로 수놓은 수묵화처럼.
숲을 거닌다.
자욱한 안개 속으로 스며들 듯이 걷는다.
철 지난 캠핑장에는 아무도 없다.
사람도, 다람쥐도, 새 한 마리도 없다.
그림 속을 걷는 기분이다.
천 년 전 어느 화공이 그린 그림 속을
나 홀로 휘적휘적 걷는 느낌이다.

숲을 지나자 강이다.
저 강이 안개를 피워 올렸을 것이다.
강은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안개만이
기억조차 못하는 전생의 어느 날이나
알길 없는 미래의 불안한 저녁처럼
허공을 두껍게 덧칠하고 있다.

사는 일이 안개 속이다.
길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서 있는 곳조차 알 길 없다.
분명 이 안개 속에 나를 감싼 세상이 있건만
수건으로 눈을 가린 술래처럼
그저 캄캄한 어둠이거나
하얗게 표백된 안개 속이다.
그 어둠, 혹은 표백된 안개 속에서
출구 없는 인생들
세상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독한 사람들은
가엾은 존재감을 저 혼자 어루만지며 서성이고 있다.

강물 곁으로 내려선다.
조약돌 밟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다.
갈대 수술이 귓불을 스친다.
이슬이 얼음처럼 차갑다.
퍼덕~
물고기 한 마리가 발치 앞에서 자맥질을 친다.
그 싱싱한 소리가 안개 속에 요동친다.
분명히 세상은 깨어 있다.
다만,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세상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다.
참, 사는 게 꿈결 같다.
김산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mountainf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