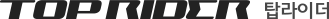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어서 옵쇼 손님, 어디로 모실깝쇼?”
“운전수양반, 저기 전봇대 누비러 갑시다.”
“좋습니다, 소인의 운전 재주 한번 기차게 보여 드리겠습니다요.“
지금도 그렇지만 전국의 자동차 보유대수 중 30%가 서울에 모여 있어 갖가지 드라이브 풍류들이 경성에서부터 생겨났다.

1914년부터 서울 장안에서 생겨난 자동차 드라이브 풍류는 1917년 한강 인도철교가 개통되자 그 열기를 더해갔다. 기생들과 풍류객들이 택시를 불러 타고 드라이브하고 싶을 때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당시의 자동차드라이브 풍습이었다.
이때만 해도 서울 근교에는 두 곳밖에 드라이브할 곳이 없었다. 이것은 바로 자동차도로니 관광지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손님이 서울장안 남대문 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전신주 누비러 가세“하면 한강철교로 가자는 뜻으로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 운전사들의 상식이었다.
한강철교 가운데 쭉 늘어서 있는 전봇대 사이를 손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S자형으로 꼬불꼬불 돌아가며 운전솜씨를 자랑하면 손님들은 손뼉을 치며 매우 기분 좋아했다. 더구나 이 때의 자동차는 가속기인 엑셀러레이터가 지금처럼 패달 식이 아니라 핸들 가운데 레버 식으로 붙어있고 바닥에는 브레이크, 클러치, 후진용 패달 세가가 달려 있어 운전수가 한창 신나게 운전할 때는 그 많은 조작기기들을 움직이랴, 핸들 틀랴 마치 권투선수가 샌드백 치는 것 같은 손놀림과 몸동작이 배꼽을 잡게 하는 또 하나의 좋은 구경꺼리였다. 그리고는 노들강변을 둘러 한강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물고기 매운탕에 약주 몇 사발을 들고 돌아오는 멋이었다.
또 종로거리에서 차를 타고 “오줌고개 가세“ 하면 정릉을 거쳐 청량리 쪽으로 가자는 뜻으로 알고, 서대문 구치소 뒤 악박골 약수터에 먼저 들려 여자들은 엿을 사먹고 남자들은 입구에선 주막집에서 약주 두어 사발에 굴비를 뜯은 후 거나한 기분으로 오줌고개인 지금의 정릉 아리랑고개를 넘어 능수버들 늘어진 청량리길을 달려 영도사나 청량사 또는 홍릉을 돌아오는 멋이 고작이었다.
이 두 곳이 1920대년 초 서울에서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였고, 한 번 갔다 오는데 택시 전세비만 10원 정도 들었다. 돈 많은 한량들의 드라이브 풍류는 택시운전사들에게 `팁`이라는 새로운 수입원을 안겨 주었다. 이렇게 한번 택시 드라이브를 하고나면 차비 외에 5~10원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풍류계의 관습이었다. 특히 기생들의 팁이 푸짐하여 요정과 기생은 택시운전수들의 최대의 `봉`이라서 기생과 택시는 바늘과 실의 관계였다. 이러니 기생을 잘 모실 수밖에 없었다.
“여보게들 창경원 벚꽃구경 안 가려나?”
“오늘은 공일이라서 전차가 매우 붐빌텐데, 고생 안 하려면 슬슬 걸어가지.”
“그러지 말고 우리 택시계 모았잖은가. 그 돈으로 택시 한번 타고 가세.”
“이 사람아, 그 돈은 올 가을 황해도 백암온천가려고 택시비로 모은 계가 아닌가. 그러지 말고 창경원까지 3원이니까 우리 다섯이 60전씩 갈라내면 택시탈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하세.“
서울 창경원의 벚꽃놀이도 드라이브 코스 겸 관광지로 1910년대 말부터 인기가 높았다. 봄 벚꽃놀이가 벌어질 때는 일요일만 되면 행락인파를 실어 나르기에 바빠서 택시는 불티났고, 한 번 가는데 3원이라 혼자 내기가 벅차면 친구들 4~5명이 모여 합승한 후 나누어 내는 풍습도 생겨났다.
전영선 소장 kacime@kornet.net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www.top-rider.com)>
전영선 소장 〈탑라이더 kacime@kor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