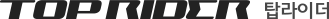코리아 그랑프리가 F1 2014 시즌 캘린더에서 빠진 뒤 ‘평소에는 전혀 관심을 표하지 않던 많은 언론과 일반인들이 앞다투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나섰다. 심한 경우 애당초 F1 그랑프리의 개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비판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의도나 문제 제기 시점이 어떻든 다양한 비난들 중에는 귀 기울어 들어야 할 이야기도 많다.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가 폭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입지에 대한 것이다. 많은 경우 서킷의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비판에만 열을 올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말 F1 그랑프리가 열리는 서킷의 입지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다양한 해외 서킷의 예를 통해 어디까지가 문제를 제기할만한 부분이고, 어디부터 우리의 ‘상식’이 잘못된 것인지를 점겅해 볼 필요가 있다.

모터스포츠의 종주국으로 자처하는 나라 중 하나이자 최초의 F1 월드 챔피언십 그랑프리를 개최하기도 했던 영국에 F1 그랑프리를 개최한 서킷은 모두 네 곳이 있다. 이들 중 실버스톤과 브랜즈 햇치는 영국을 대표하는 서킷으로 손꼽힌다. 1963년부터 1986년까지 24시즌 동안 실버스톤과 브랜즈 햇치는 영국 그랑프리를 번갈아 개최했고, 두 서킷 모두 팬들과 드라이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1987년 이후로 영국 그랑프리는 실버스톤에서 계속 개최되었고, 2000년대 중반 실버스톤이 영국 그랑프리의 개최권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도 도닝턴 파크가 부상했을 뿐 브랜즈 햇치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브랜즈 햇치는 실버스톤보다 훨씬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브랜즈 햇치는 런던에서 단 35 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한 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지만, 실버스톤은 런던에서 100 km 이상 이동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두 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브랜즈 햇치는 소음 제한 법규 등의 이유로 그랑프리 레이아웃의 사용이 제한되며 다시 F1 그랑프리를 개최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반면, 실버스톤은 최근의 실버스톤 윙 신설 등 서킷 리뉴얼과 투자 개발자 유치 등을 통해 ‘F1의 고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혀가고 있다.

영국 못지 않게 스스로를 모터스포츠의 종주국으로 여기는 또 하나의 나라는 프랑스다. 1906년 최초의 그랑프리를 개최했고, 1950년부터 F1 월드 챔피언십이 시작된 이후 그랑프리를 개최한 서킷만 일곱 곳에 이른다. 이 중 최근의 F1 그랑프리에 사용된 서킷은 마니-쿠르와 폴 리카르 두 곳이다. 마니-쿠르는 최근 마지막 프랑스 그랑프리였던 2008년까지 대회를 유치했고, 마니-쿠르 이전에 프랑스 그랑프리가 치러졌던 폴 리카르는 F1 프랑스 그랑프리가 부활할 경우의 개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니-쿠르는 프랑스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 파리로부터 무려 250 km 이상 떨어져 있고, 파리 시내를 빠져 나와 서킷까지 가는데 보통 3시간 가량이 걸린다. 폴 리카르의 경우는 ‘모든 것을 수도 혹은 최대 도시로부터의 거리로 생각하는’ 우리네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폴 리카르는 파리에서 800 km 가량 떨어져 있고, 차를 타고 이동한다면 8시간 가량의 이동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 페라리의 본거지인 마라넬로나 인근의 밀라노가 오히려 더 가까울 정도다.

그렇다면 최근 F1 캘린더에 추가된 그랑프리가 개최되는 서킷의 입지는 어떨까? 가장 최근에 새로 F1 그랑프리가 열린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서킷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이라는 광대한 나라의 특징 덕분에 수도나 최대의 도시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 서부 최대의 도시 LA로부터 2,000 km 이상 떨어져 있고, 미국 최대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뉴욕부터는 3,000 km 이상 떨어져 있다. 이쯤 되면 수도나 최대 도시로부터의 거리가 서킷의 입지에 중요한 결정 요소를 가지고 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수도권과 가까웠다면 관객 동원이 훨씬 유리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수도권에서 F1 그랑프리가 개최되었다면 한 두 명이라도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하는데 유리했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연 ‘멀기 때문에’ 전라남도 영암까지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얼마나 유료 관객으로 서킷을 찾았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앞서 F1 그랑프리의 특수한 상황이나 모터스포츠라는 종목의 특수성은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F1 그랑프리와 모터스포츠의 관객 동원을 일반적인 스포츠 이벤트의 관객 동원과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사실상 관객의 접근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수도권에 시가지 서킷을 건설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싱가폴 그랑프리의 성공 사례(?)도 존재하고, 2014년 처음 F1 그랑프리를 유치하는 러시아 소치의 경우도 시가지 서킷이라는 점이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시가지 서킷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소음 규제나 관련 민원 문제는 시내에서의 모터스포츠 이벤트를 크게 제한한다. 실제 F1 그랑프리가 열리고 있는 시가지 서킷들은 모두 관광 상품의 일환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성립되고 있다.
F1 그랑프리가 열리는 서킷이 대형 축구 경기장보다 열 배 이상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가격 역시 중요한 요소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 서킷을 건설했다면 엄청난 부동산 가격을 부담해야 했을 것이 분명하다. 시가지 서킷이라면 건설 비용 면에서는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랑프리 기간 1 주일 이상 상당량의 도로에 대한 교통 통제 등 운영 관리에서 더 큰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관람석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애초에 동원할 수 있는 관객의 수가 크게 제한될 수도 있다. 싱가폴 마리나 베이 시가지 서킷의 그랜드스탠드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 비해 절반 정도의 관객 밖에 수용하지 못한다.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보다 잘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입지에 대해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수도권에 서킷이 있었다면 유리한 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F1 그랑프리가 개최되는 서킷의 입지는 수도나 최대 도시와의 거리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적어도 코리아 그랑프리에 문제를 지적하고 입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한다면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 대해 바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앞서 ‘어째서 모든 엔터테인먼트 이벤트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야 하는지’, 혹은 ‘어째서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이어야만 하는지’ 묻는 게 먼저가 아닐까?
윤재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jesusyoon@gmail.com〉
관련기사
윤재수 칼럼리스트
jesusyo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