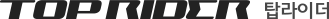이 바람은 어디서 오는가.
섭지코지 해변에 둥지를 튼 나의 텐트를 향해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제주의 푸른 밤을 딛고 와 테이블에 놓인 책장을 넘기고, 내 머리칼을 가벼이 쓸고 가는 이 바람은 어디서 오는가. 영혼의 밑바닥까지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바람에는 풋풋한 향기가 있다. 생머리를 찰랑이며 걷는 여인을 스쳐 지나 때 훅 끼쳐 오는 샴푸 향 같은.
시인 서정주는 ‘자화상’에서 자신을 키운 것은 팔할이 바람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가난과 천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물세 해를 바람처럼 떠돌았다. 시인에게는 바람이 되어, 그물이나 잔가지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어 세상 속을 부유하는 것만이 가도 가도 부끄러운 세상을 향한 젊은 날의 유일한 저항이였다.

나에게도 바람 같은 시절이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구속한다고 느끼던 서른 즈음, 그녀가 나에게 작별을 고했다. 천백이십삼 일을 함께했던 사랑이 지나갔다. 그녀의 이별 통보는 내가 세상과 맺은 모든 인연을 싹둑 자르라는 신호와도 같았다. 그녀와 이별한 순간부터 내게는 사랑도, 일도, 친구도 의미가 없었다. 더 이상 서울이란 공간에 내가 설 자리는 없다고 여겼다. 바람이 되고 싶은 욕망만이 가슴속에서 풍선 처럼 부풀어 올랐다.
바람을 꿈꾼 나의 첫 여정은 제주도였다.
오늘처럼 계절이 가을을 굴려 겨울로 가던 때, 나는 제주의 바다를 헤맸다. 비자림의 깊은 숲에서 잠들었고, 마라도의 등대 아래에도 몸을 뉘었다. 그때도 바람은 오늘처럼 풍성한 그리움을 안고 밀려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많은 제주의 푸른 밤 중에서도 성산포를 잊지 못한다.
그날 섭지코지의 모래언덕 속에 텐트를 쳤다.
성산포에 저녁노을이 물드는 것을 보며 술잔을 걸쳤다. 외로웠다. 세상의 인연을 모두 끊고 바람이 되어 떠돌고 싶다는 욕망은 보름을 버티지 못했다. 그녀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컸다. 그녀에 대한 그리움은 보름을 향해 가는 상현달처럼 커져만 갔다.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바다가 흔들렸다. 나는 실성한 사람처럼 해변을 걸었다. 도저히 그대로 쓰러져 잠들 수가 없었다. 오늘 밤은 짐승처럼 울어야 속이 풀릴 것 같았다. 부드럽게 밀려오는 파도가 발목을 적셨다. 나는 파도의 위로를 받으며 이생진 시인의 ‘그리운 바다 성산포’를 뇌까렸다.

성 산 포 에 서 는
남 자 가 여 자 보 다
여 자 가 남 자 보 다
바 다 에 가 깝 다
나 는 내 말 만 하 고
바 다 는 제 말 만 하 며
술 은 내 가 마 시 는 데
취 하 긴 바 다 가 취 하 고
성 산 포 에 서 는
바 다 가 술 에
더 약 하 다
그날 밤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수화기에 들려오는,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확인한 후 나는 말도 없이 수화기를 바다에 가까이 대줬다. 술에 취한 성산포의 파도 소리를 그녀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파도가 해변을 핥으며 부서지는 그 잔잔한 흔들림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얼마쯤 흘렀을까. 그녀는 아직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녀도 파도처럼 소리없이 울고 있었다.
김산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mountainf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