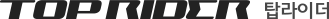검은 하늘에 섬광이 번쩍한다. 하나, 둘…. 미처 셋을 세기도 전에 천둥이 친다. 바로 머리 위에서 번개가 내린 모양이다. 그렇게 번개와 천둥이 몇 번 텐트를 두들기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빗줄기가 세차다. 텐트 속은 난타의 공연장처럼 빗방울 긋는 소리로 낭자하다. 바람도 사정없이 분다. 밤나무 그늘 아래 친 텐트 위로 밤송이가 투두둑 떨어진다. 가을비치고는 너무 요란스럽다. 본래 가을비는 뼛속까지 스밀 듯이 슬금슬금 내리는 것이 아니던가. 보슬보슬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네 가슴도 기억 속 먼 바다를 헤엄치며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립던 시절을 떠올려야 정석이다. 그러나 오늘 내리는 비는 폭풍처럼 위협적이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발정기의 들고양이가 보내는 앙칼진 울음처럼 사납다. 기억 속 먼 바다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지금은 그저 비바람 속에 텐트가 안전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웃 텐트의 타프가 날아간 모양이다. 타프가 깃발처럼 나부끼는 소리가 들린다. 캠퍼의 다급한 목소리에 연이은 망치질 소리가 머리맡으로 날아든다. 그 사이에도 번갯불이 번쩍번쩍한다. 번개가 사정없이 내리는 밤에 '수중전'을 벌이고 있을 캠퍼를 생각하니 안쓰럽다. 이웃 텐트의 캠퍼는 지금 흠뻑 젖었을 것이다. 봉변도 이런 봉변이 없다고 여길 것이다. 자정까지 멀쩡하다가 새벽녘에 기습적으로 돌풍과 함께 찾아온 가을비라니.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을비가 미워진다. 왜 이리 극성인가. 가을비는 새벽녘에 한 번 더 심술을 부렸다.

밤은 그렇게 뒤숭숭하게 지나갔다. 다행스런 것은 날이 밝으면서 비구름이 물러갔다는 것이다. 눈을 떴을 때는 텐트 안이 환했다. 해가 올라온 모양이다. 햇살이 몰려드는 텐트 지붕에는 가을비가 추상화를 그려 놨다. ‘물방울 작가’로 알려진 김창렬 화백의 그림처럼 텐트 지붕에는 크고 작은 물방울이 방울방울 걸려 있다. 그림 속 물방울과 똑 같다. 아니, 한 가지 더 있다. 몇 잎의 낙엽이 물방울 속에 들어앉아 계절이 가을임을 알려준다.

텐트 밖에서 다시 힘찬 망치질 소리가 들린다. 캠퍼들이 가을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인다. 텐트 문을 연다. 화창한 가을 하늘이 텐트 속으로 밀려들어온다. 그 아래 산은 어제보다 더 붉다. 아마도 간밤 요란스럽게 내린 가을비에 나무들이 많이 놀란 모양이다.
김산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mountainf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