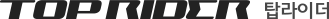그의 손길은 아주 섬세했다. 커피 그라인더에 커피 빈을 넣고 돌릴 때도 행여 한 알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했다. 커피를 따르기 전에 뜨거운 물로 잔과 드리퍼를 데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드리퍼 안에 필터를 깔고, 그 위에 곱게 간 커피를 넣은 후 아주 조심스런 손길로 주전자의 물을 부었다. 학처럼 목이 긴 그 주전자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주전자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는 대나무 대롱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처럼 가늘었다. 중심에서 밖으로, 조심스럽게 주전자를 놀리자 커피 속에서 거품이 보글보글 피어나 마치 검은 버섯처럼 됐다. 드리퍼를 통과한 커피가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머그잔에 떨어졌다.
그는 아내의 취향도 잊지 않았다.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익숙한 솜씨로 블렌딩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내가 커피를 한 모금 음미한 후 좋은데 라는 말을 하기까지 따뜻한 눈길로 바라봤다.

스무 살 언저리의 가을이었다. 지리산이 뒷산이라고 자랑하는 친구의 집에 간 적이 있다. 녀석의 집은 함양 읍내의 상림 근처에 있었다. 상림은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이 조성했다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활엽수가 빼곡하게 자라있는 아름다운 공원이다. 가을이면 낙엽이 발목까지 쌓이는 그 숲은 매력적이었다. 나는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에 그 숲을 산책하는 행운을 누렸다.
낙엽이 발밑을 치고 가면서 사각사각 내는 소리가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림을 주던 그날 아침. 나는 친구의 집으로 돌아오다 문득 어떤 향기에 이끌렸다. 그 향기는 지금까지 맡아본 적이 없는 은은한 향취였다. 이 향기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 나는 그 묘한 향기에 끌려 코를 벌름거렸다. 그리고 발견한 곳은 지하의 작은 다방이었다. 향내는 그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서야 그 향기의 주인이 커피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커피향에 이끌려 지하다방으로 내려갔다. 내가 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마담이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른 아침부터 웬 손님인가 싶은 표정이었다. 마담은 아직 화장 전이었다. 잠자리에서 빠져나온 부스스한 얼굴 그대로였다. 머리는 더부룩했고, 맨 얼굴은 기미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커피 되나요?”
마담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으로 사라졌던 마담은 잠시 후 커피를 내왔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는 커피 마시러 안 오는데…….”
“아~예. 산책을 나섰다가 커피향이 너무 좋아서 그만…….”
“그래요? 커피를 마실 줄 아는군요? 사실, 우리 집 커피 맛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커피를 아끼지 않고 진하게 내리는 편이거든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마담은 커피향이 좋다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었다. 마담은 주방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카운터에 있는 카세트를 틀었다. 흔한 팝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아니 음미했다. 거리에서 맡았던 그 향을 떠올리며 커피 한 모금을 물고 혀로 굴려가면서 커피 맛을 봤다, 그러나 커피 맛은 나의 기대를 저버렸다. 거리에서 맡았던 그 향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커피는 소태처럼 쓰기만 했다. 뭐랄까, 커피는 단물 쓴물 다 빠져버린, 한물간 마담을 쏙 빼닮았다.
괜히 들어왔다 싶었다. 하지만 싫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카운터에 앉은 마담은 연신 담배를 꼬나물며 나를 바라봤다. 마담의 눈빛은 커피 맛이 괜찮으냐고 물어보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런 마담에게 애써 웃음을 지어보이며 화답할 수밖에 없었다.
숲에 가을이 불탄다. 아주 작은 바람에도 낙엽들이 생을 마감하고 떨어진다. 아침저녁으로 소슬한 바람이 목덜미에 감긴다. 그 서늘한 기운에 몸이 움츠려 들면 커피향이 그립다. 아른 아침에 나를 붙들던 상림의 커피향이 그립다. 캠핑장에서 한 남자가 아내를 위해 정성을 다해 내리던 그 커피 한 잔이 그립다. 가을은 그리운 것이 많은 계절이다.
김산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mountainf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