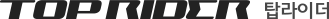인제 방태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한 것은 해거름 무렵이다. 벌써 야영장으로 가는 비포장도로에는 어둠이 내려서고 있다. 제1야영장에 일찍 자리를 잡은 캠퍼들은 저녁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화로에는 알맞은 높이로 불꽃이 일었고, 아이들은 모닥불을 쬐며 캠핑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야영장을 감싸고 쏜살같이 흘러가는 계곡물에도 저녁노을처럼 불빛이 물들었다.

제2야영장에도 몇 팀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며칠 전 폭우가 내린 탓에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가 벼락 치듯 하다. 가급적 계곡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 사이트를 꾸리려 했지만 별반 신통치가 않다. 계곡물소리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날에는 볼륨을 높인 TV를 켜놓고 잠들었다고 여기는 수밖에 없다.
숲은 짙은 어둠에 휘감겼다. 방태산은 낮에도 무섬증이 일만큼 숲이 깊다. 나는 이 깊은 숲 때문에 방태산을 이 땅에서 가장 깊은 산이라고 주장한다. 높이로 따지면 방태산은 지리산의 어깨까지 밖에 안 된다. 그러나 어느 곳을 들머리로 잡아도 숲은 깊고, 계곡은 끝이 없어 보인다. 아침나절밖에 밭을 갈지 못할 만큼 해가 짧다는 아침가리골이나 산 중턱에 자리해 존재조차 몰랐던 개인동이 방태산의 깊은 품을 말해준다.

방태산은 언제 찾아도 좋다. 신록이 물드는 봄이나 오늘처럼 계곡이 야단법석을 부리며 흘러가는 여름이나, 낙엽이 이불처럼 쌓이는 가을, 함박눈이 가득한 겨울, 계절 마다 모습을 달리하며 아름다움을 뽐낸다. 특히, 여름은 이곳보다 좋은 피서지가 없다. 계곡물에 말을 담그면 정확히 열을 세기가 힘들다. 그만큼 차갑고 시리다. 숲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 숲에 들어앉아 있으면 불볕더위니 삼복이니 하는 말은 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처럼 여겨진다.
방태산을 감싸고도는 강줄기가 있다. 내린천이다. 오대산에서 발원하는 이 물줄기는 방태산을 한 바퀴 빙빙 돌아 인제읍을 거쳐 소양강으로 흘러간다. 지금은 누구나 쉽게 찾는 강이지만 한때는 여행 마니아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홍천 살둔에서 인제 미산리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차로 가려면 얼추 이백리를 돌아가야 했다. 그보다 10년 전에는 살둔으로 가는 길도 없었다. 창촌에서 살둔까지 강을 따라 서너 시간을 걸어가야 했다. 그때 잡지사 선배들은 술자리를 할 때면 교교한 달빛을 받으며 강물을 따라 살둔마을로 가던 무용담을 들려주곤 했다. 그것은 하나의 전설이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내가 내린천을 걷는 기분이었다.
십여 년 전의 일이다. 오지마을 취재차 개인동을 찾은 적이 있었다. 당시 미산리에서 개인동까지는 비포장길로 7km를 가야 했다. 길이 어찌나 구불텅하고 비좁던지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지금도 소심한 사람들은 운전대 잡기가 겁이 나는 곳이 개인동 가는 길이다.

그렇게 힘들게 찾아간 개인동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예나 지금이나 몇 가구 살지 않는 덕에 저녁이 되자 객꾼들이 몰려들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추렴을 하는데, 뜬금없이 마을 노인이 박인식을 아느냐고 물었다. 박인식이 누구인가. '사람과 산'을 창간한 장본인이자 당대를 주름잡던 풍류가이지 않은가. 당시 산악계에서 그를 모르면 간첩이었다. 당연히 그를 안다고 하자 노인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더니 옛 이야기 한 토막을 꺼냈다.
십오륙 년 전이라고 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큰 배낭을 메고 개인동으로 올라왔다. 당시만 해도 개인동은 심마니나 산채꾼 만이 찾던 오지 중의 오지였다. 특히, 외지인이 여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서울손님’이라며 크게 환대했다. 요즘 같으면 민박요금에 밥값까지 톡톡히 받았겠지만 일절 돈 한 푼 받지 않고 밥과 술에, 잠자리까지 제공했다.
노인은 박인식과 밤이 이슥토록 산골살이의 애환을 이야기 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눈이 사슴처럼 순한 서울손님은 말수가 적어 잠자코 듣기만 했고, 이야기는 노인이 도맡았다.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에 취해 거짓부렁도 덧붙였다. 젊은 시절에 아이 장딴지만한 산삼을 캤다거나, 동자삼 뽑은 자리에서 개인약수가 솟았다는 것 등이 노인이 지어낸 이야기였다. 그때도 서울손님은 빙그레 미소만 띌 뿐 토를 달지 않았다.
다음날 서울손님은 개인약수까지 들렀다가 개인동을 떠났다. 노인은 그게 서울손님과의 인연의 끝인 줄 알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우편배달부가 두툼한 우편물을 전해주고 갔다. 우편물에는 잡지가 한 권 들어 있었다. 노인은 잡지를 뒤적이다 깜짝 놀랐다. 잡지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개인약수와 개인동 사진도 있었다. 노인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박인식이란 기자가 쓴 글에는 그날 밤 자신이 말했던 이야기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그 후 잡지는 노인에게 가보가 됐다.

그 후로 노인은 서울손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다. 노인은 서울손님에게 당시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가 있었노라고, 책에다 자신의 이야기를 실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서울손님은 다시 오지 않았다. 노인은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혹시 서울에서 그를 만나면 개인동에 꼭 한 번 와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내가 내린천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은 그 때부터다. 이제는 전설이 된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다니는 게 마냥 즐거웠다. 선배들이 들려줬던 무용담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는 일은 즐겁고도 짜릿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맑고 고운 강을 더듬고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강을 따라가다 지치면 강물 곁에 텐트를 치고 밤을 보냈다. 지금이야 정해진 곳이 아니면 야영을 할 수 없지만 그때는 어디고 먼저 자리를 잡는 게 임자였다.

강물 곁에 텐트를 치면 재잘거리며 흘러가는 강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들린다. 얕은 여울목은 강물이 조약돌에 미끄러지는 소리도 들린다. 강의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피라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허풍을 쳐도 부끄럽지 않은 게 내린천이다. 강변에 친 텐트 안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몰려온다. 그 소리는 하나같이 평화롭고, 어머니 손길처럼 따뜻하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은 적이 없는 따뜻한 위로가 느껴진다.
내린천을 오가는 길이 나고, 차들이 강변을 따라 질주해도 그곳에는 아직 사랑할 것이 많다. 강물이 감싸듯이 흘러가는 살둔에는 지금도 오지의 정취가 남아 있다. 주인이 바뀌면서 이제는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 됐지만 귀틀집으로 지은 살둔산장의 고즈넉한 자태도 여전하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 폐교된 살둔분교에는 '반공방첩'을 써 붙인 판자교실이 남아 있다. 산삼 뽑은 자리에서 약수가 솟았다는 개인약수는 또 어떤가. 개인동까지 가기도 수고스럽지만 마을에서 1.4km를 더 걸어가야 하는 길도 만만치 않다. 누군가는 개인약수가 물이 좋아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약수터까지 오르내리다가 건강을 찾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어쨌거나 힘들게 올라가 마시는 약수 한 잔, 내장까지 후련하다. 약수도 약수려니와 한낮에도 햇살 한 올 허락지 않는 짙은 숲과 이가 부닥칠 만큼 차가운 계곡물이 있어 그곳이 그립다. 그 그리움은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더욱 짙어질 것이다.
김산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mountainf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