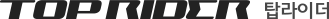근화동 선착장을 출발한 철부선이 느리게 호수를 가로질렀다. 바람 한 점 없었다. 물결은 비단결처럼 잔잔했다. 물비린내가 훅 끼쳤다. 춘천 시가지가 점점 멀어졌다. 그와는 반대로 호수에 뜬 섬 중도가 천천히 다가왔다. 오늘 하루 쉬어갈 섬이다.

언제부턴가 북한강가에 접한 이 조용한 도시를 ‘호반의 도시’라 부르고 있다. 늦가을이나 초봄, 밤낮의 일교차가 큰 날이면 어김없이 이 호숫가의 도시는 물안개를 피워 올린다. 그 자욱하게 피어난 물안개 속으로 그물을 걷으러 가는 어부의 모습이 실루엣으로 흐르고, 어디선가 후다닥 물을 박차는 물새들의 힘찬 약동이 들린다. 아침저녁으로 뜨고 지는 해는 노을빛 잉크를 풀어 호수를 물들인다. 그때쯤이면 강변을 따라 부지런히 자전거 페달을 밟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흘러가는 시간이 연출하는 이 장엄한 서사시를 감상한다.
어쩌면 춘천을 더욱 춘천답게 만드는 것은 중도 때문인지도 모른다. 춘천에 호수가 생기면서 더불어 태어난 섬 중도. 호수 가운데 떠 있다고 해서 중도다. 춘천 가는 기차를 타봤던 이들이라면 중도에서의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기차역에서 다시 선착장으로, 그리고 배를 타고 들어가면 거기 새로운 낭만이 기다리고 있다. 중도에는 플라타너스가 웃자란 곳에 펼쳐진 드넓은 잔디밭, 걷고 또 걸어도 질리지 않는 호숫가 산책로, 둘이 하나 되어 타는 자전거,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수상 스키 같은 것들이 있어 휴식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넌다는 것만으로도 청춘들의 가슴은 뛰기 마련이다. 그러다 막배를 놓치거나-의도된 것일 수도 있다-하는 날이면 청춘들의 가슴에는 불안함과 설렘이 교차한다.
오월 초순의 중도에는 플라타너스 꽃가루가 눈처럼 날렸다. 잔디밭에는 서설이라도 내린 것처럼 꽃가루가 하얗게 덮여 있었다. 그것들은 잔바람이라도 불면 일제히 날아올라 공중을 부유했다.

캠핑장 한 구석에 텐트를 칠 때였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혹시….”
나는 가만히 고개를 돌렸다.
한 여인이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퉁명스런 질문에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는 사람인가 싶어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황급히 돌아섰다. 그녀가 걸어가는 곳에 한 꼬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 곁에 선 사내도 넉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를 태운 차가 내 앞을 지나갔다. 그 바람에 쌓여 있던 플라타너스 꽃가루가 부옇게 휘날렸다. 잠시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 시간은 아주 짧았다. 차는 서둘러 선착장으로 향했다.
누구일까. 어디서 본 듯도 해서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좀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를 태운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 나는 다시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 폴을 끼우고, 텐트를 일으켜 세웠을 때였다. 책갈피를 넘기다 우연히 발견한 단풍잎처럼 명징한 추억 하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만난 것은 대학 시절 춘천 가는 기차 안에서다. 종로통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나는 갑자기 춘천 가는 기차가 타고 싶어졌다. 춘천에 특별히 볼일이 있거나 만나야할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가보고 싶었다. 밤을 꼬박 샌 뒤 우수에 찬 눈빛으로 첫 기차를 타는 일이 꽤 근사하게 여겨졌을 뿐이다. 그때 나는 그럴 나이였다.
일요일의 첫 기차는 만석이었다. 입석표를 끊었다. 나는 기차에 오르자마자 빈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주인이 오면 비켜줄 요량이었다. 그러나 밤을 꼬박 샌데다 술까지 마셨으니 어찌 그 졸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얼마쯤 지났을까. 기차가 덜컹거리는 통에 잠에서 깼다. 기차는 북한강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내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잠에 취해서도 그녀의 서글서글한 눈빛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로 했다.

“춘천까지 가시나요? 제가 자리를 양보하죠.”
“여긴 원래 제자리였는데요.”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무안했다. 그러나 이왕 부린 호기였다. 나는 그녀에게 사죄의 뜻으로 춘천을 안내하겠다고 허풍을 떨었다.
“혹시 중도 가본 적 있나요?”
“중도요?”
춘천행이 처음인 내가 중도를 어찌 알 수 있으랴. 그녀가 내뱉은 중도라는 한 마디에 괜한 호기를 부리려했던 나는 머쓱해지고 말았다.
그녀를 따라서 중도를 갔다. 춘천에 딱히 갈 곳을 정한 것이 아닌데다 아는 곳도 없어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따라 나섰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서글서글한 눈빛의 그녀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기 때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내가 동행을 자처했을 때 거부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내가 치근덕거리는 모양새였는데도 그녀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배를 타고 들어간 섬에는 오월의 화창한 기운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쁜 표정들이었다. 그들 사이에 있는 우리도 처음 만난 사이치고는 크게 어색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호숫가를 거닐고, 컵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남들처럼 그렇게 중도의 봄날을 즐기다가 서울로 돌아왔다.
우리는 청량리역에서 헤어졌다. 다시 만날 수 있겠냐는 말이 혀끝에 맴돌았다. 그러나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했다. 너무 속물처럼 보일 것 같아 애써 참았다. 만날 때처럼, 헤어질 때도 기약 없이 발길을 돌리는 게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돌아서는 내게 춘천 구경을 시켜준 것에 대한 답례라며 시집 한 권을 내밀었다. 신동호 시인이 쓴 ‘저물 무렵’이라는 시집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춘천으로 이끈 것은 이 한 권의 시집이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말을 마친 그녀는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그녀와의 인연은 그날 하루가 전부였다. 그러나 나는 그 후로 오랫동안 사랑을 하지 못했다. 언젠가 다시 그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우연히 다가왔던 인연처럼, 언젠가 다시 그 인연의 끈이 이어질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녀가 생각날 때마다 ‘저물 무렵’에 수록된 ‘춘천역’이라는 시를 떠올리곤 했다.

노을이 잠겨 있었네
거기에서는 무료한 사람들의 세월이
떠나지도 도착하지도 않은 채
안갯속에 잠겨 있었네
문득 옛사랑 낯익은 얼굴을 만나고 돌아서면
비로소 기억 저 편 놓이는 추억
그 오랜 것들은 아름답던가
추억은 춘천역 모서리 벤치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의 눈물과 체온도
안갯속에 젖어들었네
내내 앞만 보고 달리던 동안의 묵묵한 세월과
그 세월 속에 뿌려진 사랑의 기억들
- 중략 -
나는 그녀가 머물렀던 자리로 텐트를 옮겼다. 생애 하루 겹쳐졌던 우리의 인연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그녀는 지금 배를 탔을까. 그녀도 노을에 젖은 호수를 보며 순수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을까. 훗날 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마도 오늘은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다.
김산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mountainf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