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상대방의 호의에 호의로 답하는 교양 있는 인간인가? 대체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달리해보자. 당신은 상대방이 파렴치한 일때도 교양있게 받아칠 수 있는가? 두번째 질문에는 쉽사리 ‘그렇다’라고 대답하긴 어렵다. 막상 이러한 상황이 실제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더더욱 난감해질 것이다.

극단 여행자가 2월 19일부터 대학로 정보소극장에서 올리고 있는 연극 [오후 네시](작 아멜리 노통브, 연출 조최효정)는 오후 4시마다 찾아오는 파렴치한 이웃으로 인해 겪게 되는 삶의 작은 균열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관객은 초반 에밀(전중용)의 편이다. 파렴치한 이웃 베르나르댕(이정수)의 정기적인 방문에 에밀과 마찬가지로 인내심을 참지 못했으니 말이다. 즉, 에밀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상대에게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에밀과 그녀의 부인 줄리엣(김은희)은 오후 네시가 다가오는 게 싫다. 표면적으론 불청객의 방문을 겁내고 있는 게 이유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 부부에게 오후 네시는 교양이든 친절이든 다 내 팽겨치고 싶은 마음 속의 울림을 꾹꾹 누르며 무장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극이 진행될 수록 관객들은 에밀의 편에 있다는 게 불편해진다. 절대 남에게 해꼬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가 감춰둔 내면을 드러낼 때 관객의 내면 역시 들킨 듯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청객 베르나르댕의 속사정이 하나씩 밝혀지자 그를 나쁜 놈으로만 몰고 갈 수도 없다. 여기에 한가지 더. 자신에게는 절대 없을 거라고 여겼던 악마성이 에밀과 줄리엣의 대화와 행동으로 눈앞에서 보여지자 그들 부부가 얄미워지기 시작한다.
연극은 에밀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베르나르댕의 아내(정수영)를 등장시킨다. 여기서도 에밀 부부는 이웃 사람에 대한 예의로 치매 걸린 그녀에게 최대한 신경을 쓰고자 한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에밀 부부의 친절은 오히려 베르나르댕의 아내에게 독으로 다가온다. 또한 난로에 기름이 없어 둘만 있을 때는 담요를 뒤집어쓰고 있을지라도 손님이 올때는 잽싸게 난로 불을 켠다. 이렇듯 연극은 관객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장면 장면이 지닌 의미를 입체적으로 무대로 불러냈다.

연극의 메시지가 증폭되는 지점은 잘 차려진 식탁에서 베르나르댕 부부가 우악스럽게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실제 음식 없이 접시와 포도주등만 세팅 되어있는 식탁에서 두 배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음식들을 입안에 집어 넣는다. 관객들의 상상력이 겻들어져 이 장면은 예상외로 그로테스크하다. 여기서도 에밀 부부는 예의를 차리고 있을 뿐이다. 마치 에밀부부가 타자의 입장에서 역겨운 자아(베르나르댕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인상 역시 줘 울림은 상당히 크다.
지난해 [마릴린 먼로의 삶과 죽음]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여성 연출가 조최효정의 손길이 닿아있는 이번 작품은 원작 소설에서 느끼기 어려운 섬세한 장면 장면을 연극 특유 화법으로 만들어냈다. 연기의 폭과 깊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드러내는 네 배우들의 호연으로 더더욱 작품에 애정을 갖게 했다. 특히, 이정수와 정수영의 밀도감 있는 연기가 끝까지 작품에 힘을 실어줬다.

오후 네시의 방문이라는 단순한 사건에서 출발했으나 그 끝은 한사람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만들었다. 에밀은 묻는다 ‘눈이 녹으면, 그 흰빛은 어디로 가는가?’라고. 눈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녹아버리듯 자신이 굳건히 믿었던 에밀이란 존재는 더 이상 여기 없다. [오후 네시]를 보고 나온 관객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게 했던 인생의 신념이 흔들리더니 곧 사라지기 까지 하는 것을 깨닫고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상당히 매혹적인 당혹스러움이었다는 점이 이 연극이 지닌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차후 극단 여행자는 한국 고전 소설 중 유일한 비극적 사랑이야기인 '운영전'을 원작으로 하는 연극[상사몽](연출 양정웅)을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올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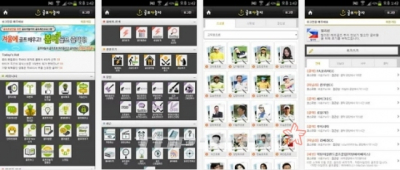









![[시승기] 볼보 S9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최강 가성비](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1/28/trd20251128000001.300x200.0.jpg)



![[시승기] 볼보 S9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최강 가성비](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1/28/trd20251128000001.122x80.0.jpg)


![[시승기] 아이오닉9, 532km 주행하는 6천만원대 전기차](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1/13/trd20251113000037.122x80.0.jpg)
![[시승기] 푸조 3008 GT, 실연비 20km/ℓ..이쁘고 경제적](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0/31/trd20251031000001.122x80.0.jpg)
![[시승기] 아이오닉6N, 믿기지 않는 완성도의 스포츠카](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0/29/trd20251029000001.122x80.0.jpg)
![[시승기] 볼보 ES90, 이상적인 시트포지션과 승차감 구현](https://www.kod.es/data/trd/image/2025/10/23/trd20251023000001.122x8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