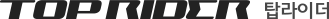서른 중반까지 나에게 가족은 없었다. 법적으로는 아내와 아이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 여지는 많지 않았다. 물론 나는 돈을 벌어왔고, 주말이면 유모차를 끌고 놀이공원을 다녔다. 처갓집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그러나 내 속에는 나만 있었다. 나의 꿈은 언제나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었다. 내 속에는 가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그리움만 가득 차 있었다.
2004년 1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아내와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밴쿠버에 나만 홀로 남겨졌다. 섭섭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내 안의 어떤 욕망이 가족과 이별하는 애틋한 마음을 딛고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의 끝까지 가보겠다는 여행에 대한 로망이었다. 나는 공항을 나오면서 다짐했다.

여행을 할 거야.
북극까지 가고 말거야.
열사의 사막에서 잠들 거야.
나는 그렇게 했다. 나에게 주어진 1년이란 시간을 남김없이 나를 위해 썼다. 알래스카의 빙하를 누비고 다녔고, 길이 끝나는 북극의 얼음나라까지 갔다. 카우보이들이 총질하던 서부의 황야에서 선인장 그늘 아래서 잠들었다. 600년 전 연기처럼 사라진 마야문명을 찾아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정글을 누볐다.
기나긴 여행의 끝은 쿠바였다. 카리브해의 낭만이 물씬한 살사와 재즈의 고향 아바나. 그곳이 내 여행의 종착역이었다. 그러나 기쁘지 않았다. 여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미지의 나라에 왔지만 내 가슴에는 구멍만이 휑하게 뚫려 있었다. 나는 아바나의 거리에서 무장해제 당한 군인처럼 서 있기도 했고, 실성한 사람처럼 목적지도 없이 거닐었다. 나는 내 속의 모든 열정이 탕진됐고, 내 몸은 카메라 셔터를 누를 힘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의 끝까지 떠돌고 싶던 욕망이 재도 없이 사그라졌다. 더는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 나의 몸과 마음은 미라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여행은 나를 병들게 했다. 나를 황폐화시켰다. 사람들은 일탈을 위해 여행을 꿈꾼다. 하지만 나에게 여행은 직업이었다. 반복되는 여행은 일상이 되었을 뿐. 나를 흥분시키지 못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맞던 생애 첫 해외여행의 설렘과 흥분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저 원고를 팔아먹을 곳을 찾아 떠도는 감정 없는 여행 생활자가 돼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울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내려앉은 아바나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으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치 못했다. 헤진 샌들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훔칠 마음이 일지 않았다. 나는 지금 어디를 걷는 것일까. 왜 이 낯선 나라에서 울고 있는 것일까. 더 이상 어디를 가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소리는 내 안에서 난 것이었다. 나는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한창 말문이 트일 때 떠나보낸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 아이가 해맑은 목소리로 아빠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 순간 미치도록 가족이 그리웠다. 지구 반대편에서 들개처럼 떠돌고 있는 사내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와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 다시 설움이 복받쳤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이다. 젊은 날의 방황을 접을 때가 된 것이다. 그날 밤 미련 없이 짐을 쌌다. 제 안에 끓는 욕망만을 좇아 살던 젊은 날의 나를 아바나에 두고 서울로 돌아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베란다 한켠에 처박아 두었던 배낭을 꺼냈다. 배낭 안에는 산에 미처 살던 시절부터 함께 했던 낡은 캠핑장비가 들어 있었다. 녹이 슨 스토브와 우그러진 코펠, 희미한 불빛으로 존재감을 표하고 있는 헤드랜턴, 무명치마처럼 빛이 바랜 텐트. 그것들을 꺼내 봄 햇살에 쬐여가며 하나씩 닦아 주었다. 이것들이 앞으로 내 인생의 2막을 함께할 할 것이다.
김산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mountainfi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