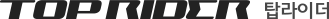지난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F1 그랑프리가 열리고 있지만, 그랑프리 개최만으로는 F1에 ‘참가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F1 그랑프리에 본격적으로 참가’하는 방법은 역시 한국 국적의 F1 팀이 나오거나 F1 드라이버가 탄생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F1 팀이나 F1 드라이버의 탄생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 수준을 봤을 때 너무나 요원한 얘기지만, 다행히 팀이나 드라이버의 탄생이 아니더라도 F1에 참가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한국 기업이 F1 팀의 타이틀 스폰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의 F1 팀 타이틀 스폰서십은 실현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F1 팀 타이틀 스폰서가 된다면 어떤 ‘부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2008년 LG가 F1 월드 챔피언십의 스폰서가 되기로 5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 F1 그랑프리기간 중 서킷 주변과 중계 화면에 LG의 로고가 부단히 노출됐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주도한 계약은 아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홍보 활동은 미미했지만, 해외 시장에서만큼은 뚜렷하게 많은 홍보 효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일찌감치 스폰서 계약을 체결해버린 롤렉스의 발 빠른 움직임에 따라 다음 시즌부터는 타임 키퍼의 자리에도 롤렉스의 왕관이 등장하면서 LG는 F1과의 짧고 굵었던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LG가 F1 월드 챔피언십의 스폰서로 활약하면서 충분한 마케팅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리겠지만, 적어도 입장에서의 한계는 분명했다. F1 월드 챔피언십의 스폰서는 로고의 노출과 단순 홍보 효과 면에서는 아주 좋은 자리이지만, F1 팀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F1과 관련된 어떤 발전적인 결과를 도모할만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기존에 자동차 문화가 후진적이고 모터스포츠에 대해 인식조차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우리네 실정에서는 수동적인 로고 노출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애초에 없었다.
그렇다면, F1 월드 챔피언십이 아닌 F1 팀에 대한 스폰서십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까?

한국 기업 역시 F1 월드 챔피언십과만 스폰서로서 인연을 맺었던 것은 아니다. 1996년 대한항공이 티렐(현재의 메르세데스 )의 스폰서가 되었고, 이듬해에는 베네통(현재의 로터스 )을 후원했다. 베네통이 르노가 되고 대한항공 대신 한진해운의 로고가 레이스카에 새겨졌다. 2001년 잠시 미나르디의 스폰서가 되었던 LG가 2010년 후반 레드불의 레이스카에 자신들의 로고를 새기기도 했다. 이런 한국 기업의 F1 팀 스폰서 참여의 와중에 한진해운이 스폰서로 참여했던 2005년과 2006년 르노가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2006년 2년 연속 챔피언에 오른 르노와의 스폰서십을2007년부터 중단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종종 눈에 띄었던 한국 기업들은 F1 팀의 타이틀 스폰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과에는 제약이 있었다. 한국 기업들은 리버리 스폰서, 즉 레이스카의 도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 스폰서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F1의 관계를 도모하고 능동적인 마케팅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F1 팀의 스폰서는 250 개 회사 이상으로 각 팀이 20개 이상의 스폰서를 가지고 있는데, 20 여 개의 스폰서 중 한 회사가 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크지 않다. 아쉽게도 한국 기업의 F1 팀 스폰서십은‘그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물론, F1 팀의 ‘타이틀 스폰서’가 된다면 얘기는 많이 달라진다.

앞선 칼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타이틀 스폰서는 F1 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레이스카의 리버리에 큼지막하게 로고가 노출되고, 팀 이름을 부르는 공식적인 자리마다 타이틀 스폰서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일단 리버리 스폰서만 되더라도 레이스카나 팀웨어에 로고를 노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많은 기회를 얻는다. 2010년 레드불에서 LG의 스폰서 자리를 재빠르게 꿰찬 브랜드 인피니티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레드불의 이미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덧씌웠다. 사실 인피니티가 레드불의 성공에 도움을 준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전무하다. 하지만, 항상 레드불 레이스카의 뒷꽁무늬를 따라다니는 중계 화면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은 ‘인피니티로부터 영감을 받은 퍼포먼스‘로 레드불이 강해진 것 같은 착각을 계속 주입 받았다.
타이틀 스폰서는 아니지만 엔진 공급자로 1980년대 후반 맥라렌과 함께했던 혼다는 아일톤 세나를 자신들의 신차 개발에 연루시켰고, 실제 그의 공헌이 어느 정도였는지 와 관계없이 NSX를 ‘아일톤 세나가 개발에 참가한 차량’으로 홍보했다. 일본인 드라이버도 아닌아일톤 세나는 마치 ‘혼다의 드라이버’인 것처럼 인식됐고, 일본에서 세나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는 가운데 F1의 인기도 동반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혼다는 그 반사이익을 누렸다.
세나의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 레드불의 타이틀 스폰서가 된 인피니티는 4년 연속 챔피언 ‘세바스찬 베텔’을 내세워 자신들의 차량에 대한 이미지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스폰서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류에 편승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류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타이틀 스폰서처럼 팀에 깊숙이 관련된 기업에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이 F1 팀의 타이틀 스폰서가 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먼저 팀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와 해당 F1 팀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메르세데스는 타이틀 스폰서 페트로나스 때문에 말레이시아 그랑프리를 홈 그랑프리로 여긴다. 페트로나스는 F1 팀을 필두로 매년 ‘우리나라에서 지난 6년간 펼쳐진 F1 관련이벤트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F1 팀에게 감 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타이틀 스폰서는 나중에 보다 깊이 개입해 (1980년대 초의 맥라렌처럼) 아예 팀을 자신의 입맛대로 개조할 수도 있다. 한국 기업이 F1 팀의 타이틀 스폰서가 된다면 페트로나스의 경우 이상으로 이슈를 만들 수 있다. 하나의 F1 팀을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에 맞게 주무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영향력은 아직은 꿈만 같은 한국인 F1 드라이버 배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든 F1 팀들은 GP2나 포뮬러 르노 3.5에 자신들의 팜 역할을 하는 팀을 거느리고 있다. 적지 않은 팀들이 그보다 더 하위 시리즈인 GP3 등에까지 F1 팀과 같은 리버리를 사용하는 팀을 거느리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어떤 F1 팀의 타이틀 스폰서가 된다면 그 기업은 한국 국적 유망주를 하위 팀에 집어넣고 일정 성적 이상이 나온다면 F1 드라이버로 데뷔시키는 계약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 현역 F1 드라이버 중에도 마루시아의 칠튼 케이터햄의 픽, 윌리암스의 말도나도, 로터스의 그로장 등이 스폰서를 등에 업고 F1 드라이버가 됐다. 이들의 스폰서는 타이틀 스폰서가 아니었는데도 가능한 일이었다. 타이틀 스폰서라면 한국인 드라이버에 대한 계약 조항을 넣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인 F1 드라이버가 탄생한다면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 판이 어떻게 급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현재 몇몇 F1 팀들은 한국 기업을 타이틀 스폰서로 맞이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고, 최근 실무 선에서 검토가 이뤄지기도 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F1 팀 타이틀 스폰서십은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판을 바꾸고 시장을 개척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진 대기업의 오너가 있는가 하는 점뿐이다.
윤재수 칼럼리스트 〈탑라이더 jesusyoon@gmail.com〉
관련기사
윤재수 칼럼리스트
jesusyoon@gmail.com